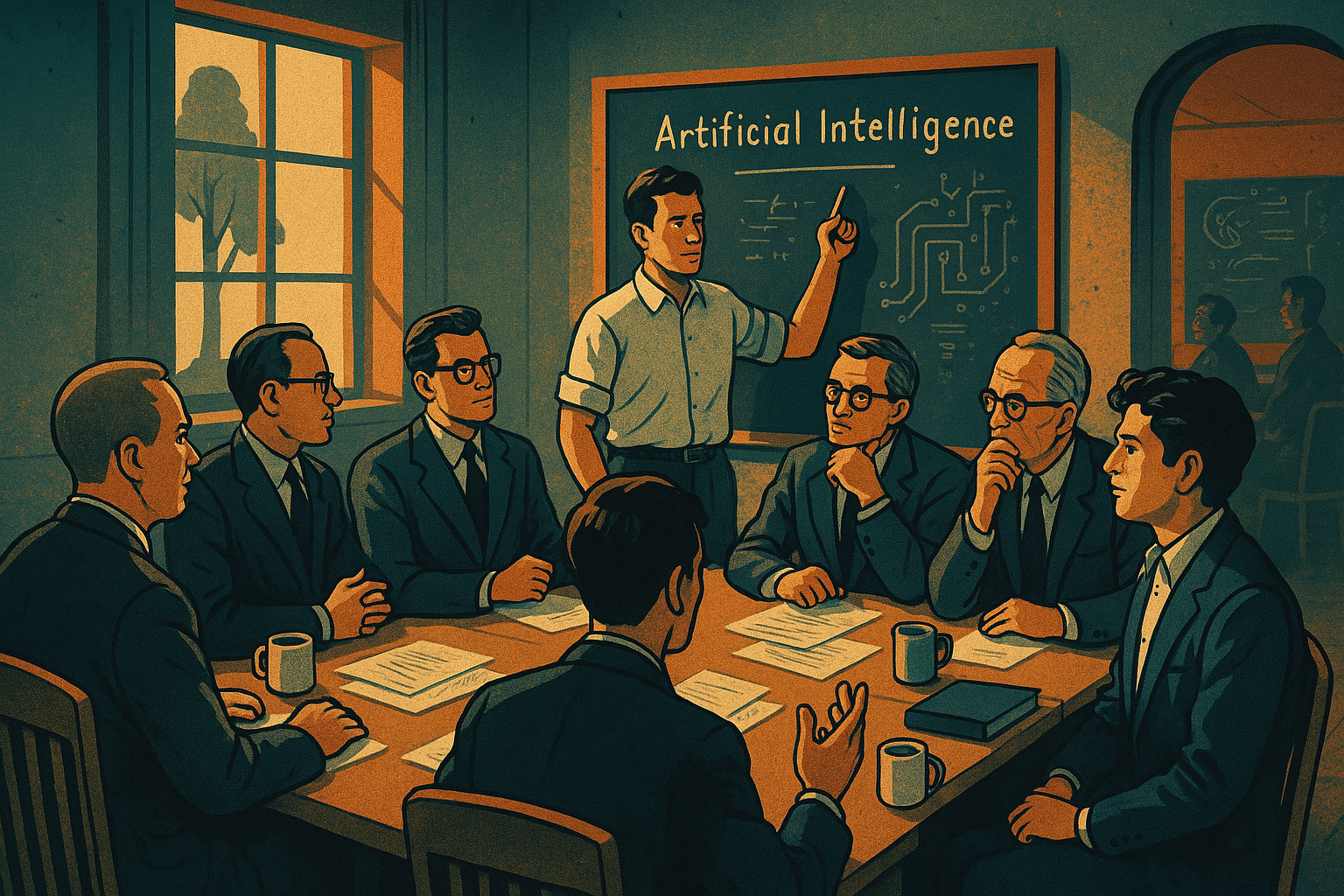
1956년 6월 18일, 뉴햄프셔주의 한적한 대학 도시 다트머스에서 열린 한 회의가 인공지능(AI)의 역사를 새로 썼다. 다트머스 대학의 매티슨 홀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존 매카시라는 29세의 젊은 수학자가 주도했다. 매카시는 1955년 가을, 동료들에게 보낸 제안서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10명의 연구자가 2개월간 집중하면 AI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했고, 이 야심 찬 계획은 미국 과학재단(NSF)으로부터 7,500달러(오늘날 약 7만 달러에 해당)의 지원을 받아 현실이 되었다. 8주간 이어진 이 회의는 마빈 민스키, 클로드 섀넌, 나다니엘 로체스터, 허버트 사이먼, 앨런 뉴얼, 트렌처드 모어, 아서 사무엘, 레이 솔로몬오프, 올리버 셀프리지 등 당대 학계의 거물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들은 수학, 컴퓨터 공학, 정보 이론, 심리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문가들이었고, 공통된 질문으로 뭉쳤다: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재현할 수 있을까?"
1950년대 중반, 컴퓨터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진공관과 릴레이로 작동하는 IBM 701 같은 기계는 방 하나를 가득 채웠고, 초당 수백 번의 연산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프로그램은 천공 카드로 입력되었고, 저장 장치는 자기 테이프에 의존했다. 이런 환경에서 기계가 언어를 이해하거나 창의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터무니없어 보였다. 그러나 다트머스에 모인 이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자 했다. 회의는 매일 아침 9시경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낡은 나무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칠판에 수식과 다이어그램을 그려 넣었다. 토론은 때로 격앙되었고, 때로 웃음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단일한 목표 아래 뭉쳤지만, 접근법은 제각각이었다.
존 매카시는 논리 중심의 접근을 주도했다. 그는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려면 수학적 논리와 상징적 추론을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믿었다. 회의에서 그는 "기계가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의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했고, 이는 이후 1958년 그가 개발한 LISP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체화되었다. LISP는 재귀 함수와 동적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 AI 연구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았다. 마빈 민스키는 신경망에 매료된 24세의 하버드 박사 과정 학생이었다. 그는 인간 뇌의 뉴런 구조를 모방한 기계가 학습과 패턴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스키는 회의에서 "SNARC"라는 초기 신경망 모델을 언급하며, 기계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 스스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당시 기술로는 실현 불가능했지만, 현대 딥러닝의 뿌리가 되었다.
클로드 섀넌은 정보 이론의 창시자로서 독특한 통찰을 제공했다. 그는 이미 1950년에 체스 두는 기계를 설계한 경험이 있었고, 회의에서 "정보의 압축과 처리가 기계 지능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섀넌은 기계가 확률과 패턴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이는 이후 확률론적 AI 모델로 이어졌다. IBM의 나다니엘 로체스터는 실무적 관점을 더했다. 그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한계를 잘 알았기에, 소프트웨어로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탐구했다. 로체스터는 회의에서 초기 "자기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허버트 사이먼과 앨런 뉴얼은 회의의 백미를 장식했다. 그들은 "논리 이론가(Logic Theorist)"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이는 러셀과 화이트헤드의 수학 원리에 나오는 52개 정리 중 하나를 독자적으로 증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문제 해결 과정을 모방했고, 참가자들에게 "기계가 사고할 수 있다"는 최초의 증거를 안겼다.
다른 참가자들도 회의에 독특한 색채를 더했다. 아서 사무엘은 체커 게임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기계 학습"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이는 훗날 그가 개발한 체커 프로그램(1959년 인간을 이김)으로 이어졌다. 트렌처드 모어는 추상적 사고를 기계에 적용하는 이론적 토대를 탐구했고, 레이 솔로몬오프는 "귀납적 추론" 개념을 소개하며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 일반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던졌다. 올리버 셀프리지는 "패턴 인식"을 강조하며, 기계가 시각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단일한 시스템으로 통합되지 못했다. 회의는 "2개월 안에 AI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다트머스 회의의 한계는 분명했다. 당시 컴퓨터는 연산 속도가 느렸고, 메모리는 1킬로바이트도 채 되지 않았다.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초보적이었다. 참가자들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냈지만, 그것을 구현할 기술적 기반이 부족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그들은 단일한 AI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고, 결과 보고서조차 모호하게 남았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를 "과대 광고에 비해 성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트머스 1956의 진정한 가치는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씨앗을 뿌린 데 있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학문 분야를 탄생시켰고, 그 이름 아래 수많은 가능성이 열렸다.
회의의 파급력은 시간이 지나며 드러났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연구로 돌아가 혁신을 이어갔다. 민스키는 1960년대 MIT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해 신경망과 로보틱스를 발전시켰고, 매카시의 LISP는 AI 프로그래밍의 표준이 되었다. 사이먼과 뉴얼은 인지과학과 의사결정 이론을 개척했고, 사무엘의 체커 프로그램은 기계 학습의 시초가 되었다. 다트머스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는 1960년대 초기 AI 붐을 일으켰고, 비록 1970년대 "AI 겨울"로 잠시 주춤했지만, 1980년대 신경망의 재발견과 21세기 빅데이터 시대를 통해 부활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AI—체스 챔피언을 이기는 딥블루, 의료 진단을 돕는 알고리즘, 자율주행차—는 다트머스에서 뿌려진 씨앗에서 자라난 열매다.
다트머스 1956은 AI 혁명의 첫걸음이었다. 그 회의는 완벽한 기술을 내놓지 못했지만,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세상에 심었다. 그 믿음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기계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지능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다트머스에서 시작된 질문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세상을 바꾸는 혁명의 문을 열었다.
'글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I 겨울의 반전: 몰락 속 피어난 혁신 (2) | 2025.04.08 |
|---|---|
| 튜링의 도발: 기계가 생각을 혁신하다 (2) | 2025.04.08 |
| 프롤로그: AI 혁명, 인간의 상상력을 뒤흔들다 (4) | 2025.04.08 |
| 섭리와 지속적 창조: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세계 (1) | 2025.04.08 |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에 관하여. (Caput XIV: De creatione rerum visibilium et invisibilium) (1) | 2025.04.08 |



